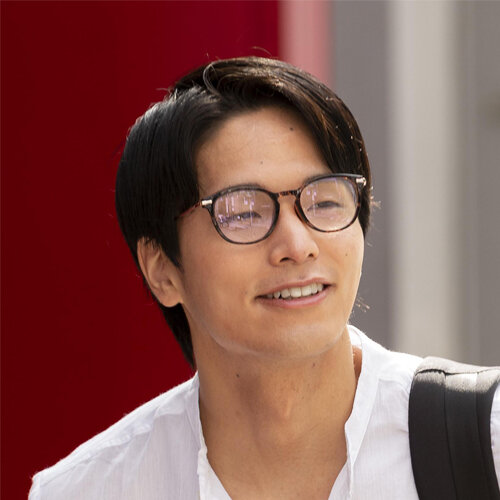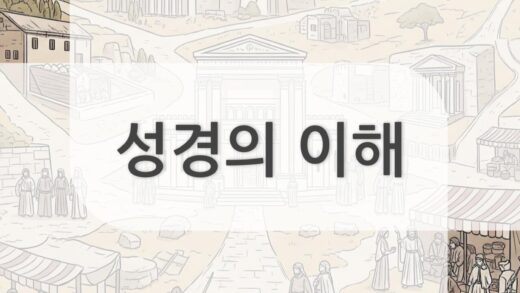하나의 뿌리, 다른 가지: 동방 정교회의 신비로운 세계를 만나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라고 하면 가톨릭과 개신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두 거대한 흐름 외에,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간직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독교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약 2억 5천만 명 이상의 신자를 보유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독교 교단인 동방 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 입니다. 그리스, 러시아, 동유럽 발칸 반도의 역사와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린 이 고대 교회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이어진 ‘정통’의 자부심
동방 정교회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세워진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라고 자처합니다. 그들의 주교들은 예수의 12사도를 직접 계승하는 후계자들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죠. 이들의 신앙은 성서뿐만 아니라 7번의 세계 공의회 결정사항을 포함한 ‘거룩한 전승(Sacred Tradition)’ 에 깊이 바탕을 두고 있으며,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의 5개 총대주교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동방 정교회는 이 다섯 교회가 동등하다고 보며, 로마 총대주교(교황)의 절대적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훗날 서방 교회와의 결별을 예고하는 중요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1054년, 그리고 그 너머: 대분열의 진짜 이유
흔히 1054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와 로마 교황 사절단 사이의 상호 파문 사건을 동서 교회가 갈라선 ‘교회의 대분열’ 시점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결정적인 분열이라기보다는 갈등이 극대화된 하나의 ‘신호탄’ 으로 봅니다. 당시 로마 교황 특사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파문의 유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두 교회의 교류는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분열의 골을 깊게 판 사건은 신학 논쟁을 넘어선 역사적 비극, 바로 1204년의 제4차 십자군 원정이었습니다. 이슬람이 아닌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략해 약탈과 학살을 저지른 이 사건은 동방 정교회 신자들에게 서방 교회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불신과 반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령의 발출에 대한 ‘필리오케 문제’와 같은 교리적 차이, 그리고 라틴어와 그리스어 사용에서 비롯된 문화적 이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두 교회는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천국으로의 창’, 이콘과 독특한 교회 문화
동방 정교회의 예배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려하고 신비로운 성화상, 즉 ‘이콘(Icon)’ 입니다. 정교회는 이콘에 묘사된 하느님, 성모 마리아, 성인들을 공경하는 것을 중요한 신앙 실천으로 여깁니다. 이콘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신자들이 기도하며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천국으로의 창’으로 간주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2차원적 그림인 이콘을 중시하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제외한 3차원적 성상 제작은 금기에 가깝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직 제도 역시 독특합니다. 가톨릭과 달리 기혼자도 사제가 될 수 있지만, 교회를 이끄는 주교직은 오직 독신 사제 중에서만 선출됩니다. 또한, 성찬예배에서는 신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모두 받는 ‘양형 영성체’를 기본으로 합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뜻하는 ‘테오토코스’ 로 공경하지만, 가톨릭의 원죄 없는 잉태나 몽소승천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황 없는 연합체,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
동방 정교회의 조직 구조는 로마 가톨릭의 중앙집권적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황이라는 절대적 권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 나라와 민족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인 교회들(독립 교회, 자치 교회)이 신앙 안에서 느슨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위에 사도 없고, 주교 위에 주교 없다"는 말처럼 모든 주교는 사도의 후계자로서 동등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연합체의 명예상 대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이며,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Primus inter pares)’ 로 존중받습니다. 그의 역할은 모든 교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회의의 의장으로서 의견을 조율하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명예직에 가깝습니다.
제국의 흥망 속에서 지켜온 신앙
동방 정교회는 동로마(비잔티움) 제국의 국교로서 성장했으며, 9세기 키릴로스와 메토디오스 형제의 선교를 통해 슬라브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키릴 문자를 탄생시켜 슬라브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된 후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제3의 로마’ 를 자처하며 정교회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통치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신앙의 명맥을 이어온 정교회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905년 러시아 정교회 선교를 통해 처음 전해졌으며, 최근에는 정교회 관련 서적이 번역되는 등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는 우리에게 기독교의 또 다른 풍요로운 유산을 보여줍니다. 중앙집권적 권위 대신 연합을, 논리적 신학만큼이나 신비적 전례를 중시하는 그들의 모습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억 명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신앙의 길입니다.